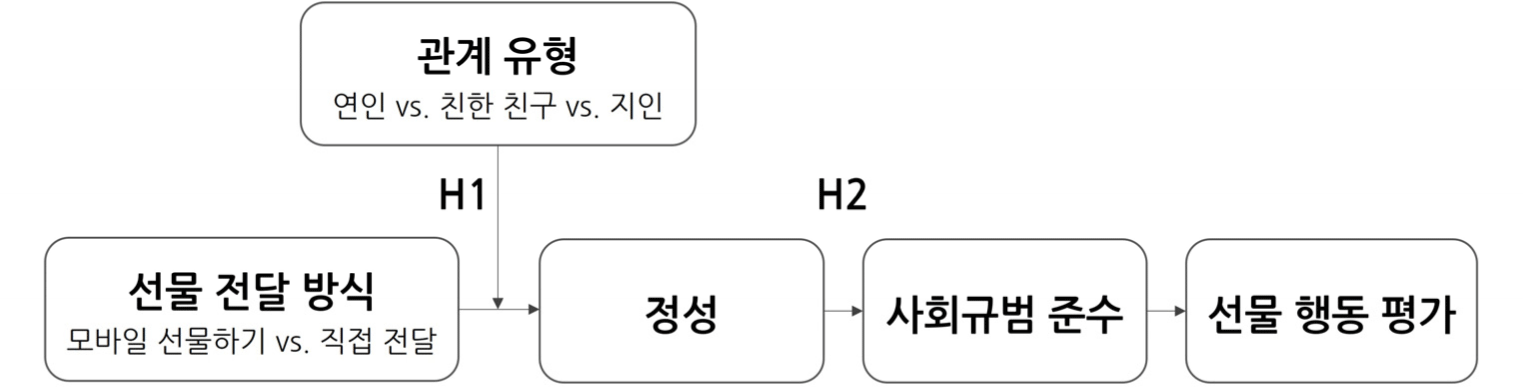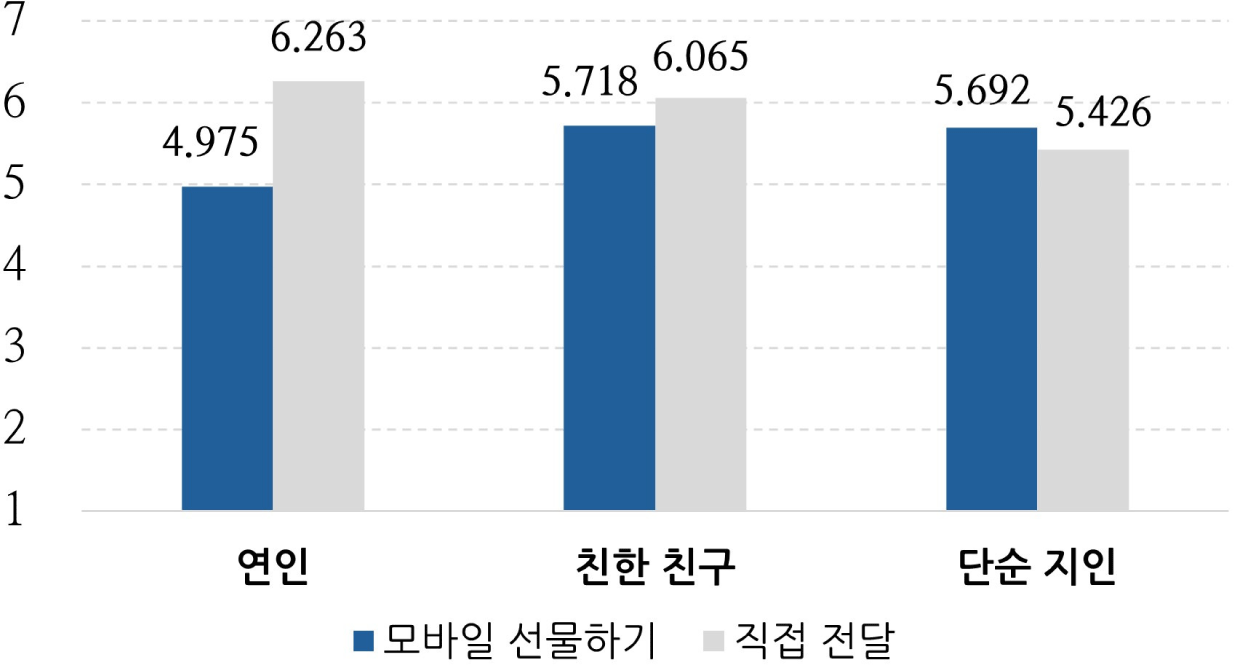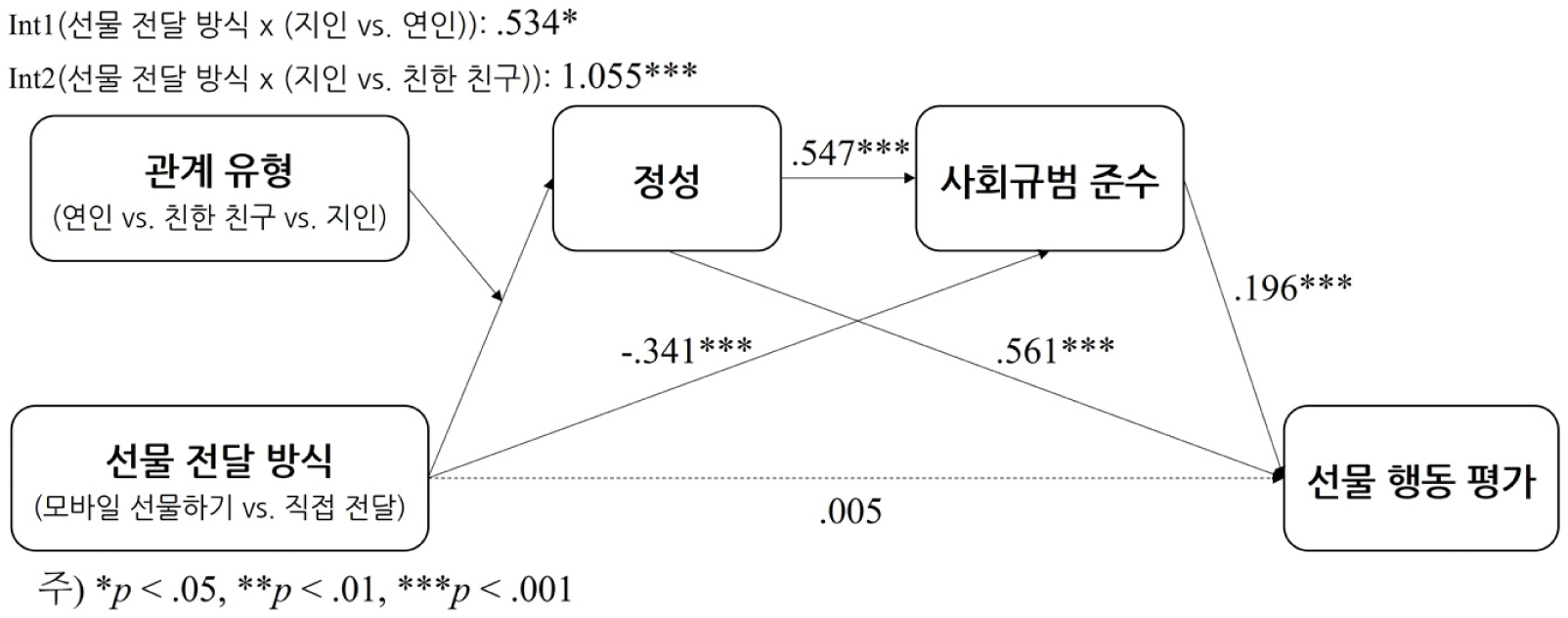Ⅰ. 서론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소비 의례인 선물 행동(gift giving)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과 유통 혁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모바일 커머스의 발전과 코로나19가 가속화 한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선물 방식으로 오늘날 진화하는 실정이다. 특히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서 선물하는 커머스 기능을 추가하여 차별화된 멀티플랫폼으로 확장하였는데(이동일, 이혜준, 2023), 2010년 12월 선보인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국내 모바일 선물하기 시장을 선도하며 빠른 성장을 일구고 있다. 후발주자인 쿠팡, SSG닷컴, 네이버쇼핑, 컬리 등 이커머스 업계도 배송 및 큐레이션 강점을 내세우며 자사몰과 모바일 앱에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하여 선물하기 시장에 뛰어들었다(김민우, 2023). 그 결과 모바일 선물하기 시장이 2011년 300억 원이었던 것이 2019년 3조 원에서 매년 20% 성장률을 보이며 2023년 약 10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김종효, 2024; 신희철, 2020). 소비자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선물을 선택하고 상대방의 연락처만으로 전달할 수 있는 편리함을 기반으로 음료 교환권과 같은 소액 선물부터 생활용품, 화장품, 의류, 고가 명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아우르는 새로운 선물하기 방식을 빠르게 수용하고 있다. 2030 세대에 집중되었던 이용자 연령도 4050 세대로 확장하며 전 연령대의 일상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박주연, 2022; 최지흥, 2023). 모바일 선물하기의 국내 시장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선물하기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87.8%, 코로나19 이후 해당 기능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8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모바일 선물하기를 보편적인 선물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엠브레인, 2023).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AI 기반 추천 및 빠른 배송과 같이 이커머스에서 구현되는 혁신뿐 아니라, 선물 포장, 각인 서비스, 수령자가 원하는 선물을 담아두거나 제품의 세부 옵션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선물 문화를 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선물 문화의 변화는 선물의 미덕에 대한 논의를 한층 더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Belk, 2013; Branco-Illodo & Heath, 2020; Fu et al., 2024).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인가’에 대한 소비자들과 학계의 오랜 화두는 모바일 선물하기라는 새로운 선물 양상의 등장과 함께 다채로운 논의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어떻게 선물을 줄 것인가’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선물 행동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Givi & Das, 2021; Reshadi et al., 2022), 선물을 직접 전달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모바일 선물 행동은 더욱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이에 모바일 선물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선물 과정이 전통적인 직접 전달 과정과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고(Hao & Hai-tao, 2020; Kim et al., 2018), 모바일 선물하기에 임하는 소비자들의 동기를 규명하는 노력이 주를 이루었다. 가령 새로운 유통 기술이 접목되었기에 혁신과 기술수용특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로서 서비스품질 요인과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가치를 살펴보고, 선물 행동 자체의 동기의 영향을 검토하였다(e.g., 권혜정, 이남경, 2024; 여현진 외, 2014; 전도현, 전현모, 2023; Hao & Hai-tao, 2020; Lee et al., 2020; Mamonov & Benbunan-Fich, 2017). 이러한 연구들은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가 편리한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 선물 구매와 전달 간 즉각적인 전달이 가능하여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이주영 외, 2014; Kim et al., 2018).
모바일 선물 행동의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선물을 매개로 하는 온라인 네트워킹의 형태라는 점이다(김하연, 이상우, 2024). 현대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고 사회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데(Riedl et al., 2013; Utz & Breuer, 2017), 모바일 선물하기를 통해서도 다양한 대상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고 유대감을 느끼고자 한다(이주영 외, 2014). 이에 연인,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신의 사회자본을 구축한다(엠브레인, 2013). 더욱이 모바일 선물 행동은 약한 유대 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이한석, 2013)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선물 행동과 대조적으로 선물 대상의 범위가 넓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선물 행동에서 선물 제공자와 수령자 간 관계 특성 또는 유형을 고려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예외: 권혜정, 여민영, 2021; 이은지,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 선물 행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선물을 주는 대상의 특성을 본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와 상호작용의 특성을 토대로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 유형을 구분한 Joy(2011)의 연구를 차용하여 연인, 친한 친구, 또는 단순 지인에게 선물하는 경우의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지 검토한다.
무엇보다 모바일 선물하기가 선물 제공자에게 편리함이라는 분명한 혜택을 주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심리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한다. 근본적으로 선물 행동은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을 동반하며 그 과정이 즐거움이 아닌 부담스러운 과제로 인식될 수 있다(Babin et al., 2007; Wooten, 2000). 또한 선물의 가치는 단순히 제품 가치 이상의 경험과 감정을 포괄하여 복합적이며, 선물 제공자와 수령자 간 판단 기준과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좋은 선물에 대한 인식 불일치(asymmetry)가 빈번하게 나타난다(Branco-Illodo & Heath, 2020; Freling et al., 2024; Teigen et al., 2005). 더욱이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는 전통적인 선물 방식에 비해 비인격성(impersonality)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Kim et al., 2018).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됨에 따라 직접적인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접촉과 따뜻함, 정서적 교감이 결여될 수 있다(Walther, 1996). 한편, 소비자들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선물에 금전적, 비금전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며 선물을 통한 관계 기여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e.g., Goodman & Lim, 2018; Park & Yi, 2022; Saad & Gill, 2003; Shi et al., 2024) 선물하기 서비스가 갖는 비인격성의 위험은 상호작용의 빈도와 깊이가 높은 가까운 관계에서 더욱 민감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관계 유형에 따라 모바일 선물하기가 선물 제공자에게 심리적 비용을 유발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선물 행동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인, 친한 친구와 같이 가까운 대상에게 모바일 선물하기를 하는 경우, 직접 선물을 전하는 것에 비해 선물로 표현할 수 있는 정성(thoughtfulness)이라는 상징적 가치와 사회규범 준수(conformity to social norms)라는 규범적 가치가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여 선물 행동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 예상한다. 반면 단순 지인과 같이 비교적 먼 대상에게 선물하는 경우, 선물 과정에 투입하는 자원과 감정적 개입 수준이 낮아(Fu et al., 2024), 모바일 선물하기에 수반되는 심리적 비용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직접 선물하는 것과 유사하게 선물 행동을 평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선물 방식인 모바일 선물하기가 선물 제공자들에게 실용적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선물의 핵심 요건인 정성의 크기와 사회규범 준수 수준에 대한 우려로 심리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최초로 규명한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선물은 관계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모바일 선물 행동을 관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접근하여 연인, 친한 친구, 단순 지인을 위한 선물 행동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제고한다. 더불어 모바일 선물하기 시장이 외형적 성장을 이루며 많은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혀진 사실 이면에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가치 판단 과정에는 보다 복잡한 셈법이 작용함을 밝혀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기업들에게 시의적절하고 세심한 통찰을 제공하는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선물하기 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되는 연인 및 친한 친구 대상 선물 제공자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 설정
선물 행동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에서부터 지속해 온 행위이다(Schwartz, 1967).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행동이기에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경영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선물 증여는 일상적인 소비 의례로(Saad & Gill, 2003) 재화를 주고받는 경제적인 교환 기능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립 및 강화하는 사회적인 기능, 또 선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기능을 갖는다(Belk, 1979; Ward & Broniaczyk, 2011).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물은 집단 구성원들 간 교환이나 호혜를 통해 사회가 통합되는 과정이고(Sherry, 1983),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으로 존재하여 그에 따르는 의무나 정치적 행동으로 해석된다(Schieffelin, 1980).
전통적인 선물 행동은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기술 혁신은 선물 문화를 변화시켜(Otnes, 2018)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의 다변화가 두드러진 실정이다. 특히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커머스 플랫폼의 선물하기 서비스 강화에 의해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메신저 기반 ‘관계형 커머스’를 표방하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한 것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 SSG닷컴, 네이버쇼핑, 컬리 등도 선물하기 서비스를 도입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자신을 위한 구매뿐 아니라 타인을 위한 선물 구매에도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이커머스 기업들이 매출 기회를 도모함에 따라 비대면 선물 문화는 우리 사회의 익숙한 일상으로 빠르게 정착하였다. 생일, 기념일과 같은 특별한 날뿐 아니라 감사, 위로, 응원, 축하 등 일상의 상호작용에 디지털 상품권이나 실제 상품을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하는 양상이 보편화된 실정이다(엠브레인, 2023).
모바일 선물하기를 이해하기 위해 선행연구는 전통적인 선물 행동과 비교하여 선물 제공자 입장에서 누리는 혜택을 규명하였다. 즉 선물 제공자가 여러 매장을 방문하여 오랜 탐색 이후 구매하는 기존의 선물 행동에 비해(Beatty et al., 1991) 모바일 선물하기는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선물 후보 제품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수월하게 탐색하고 결제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Hao & Hai-tao, 2020; Kim et al., 2018). 무엇보다, 구매 후 수령자를 만나 선물을 전하는데 시차가 있는 전통적 방식과 달리 모바일 선물하기는 구매와 동시에 선물의 전달이 이루어진다. 즉 모바일 선물하기는 선물을 구매하고 상대방에게 즉각 전달하는데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강력한 편의를 제공한다(이주영 외, 2014; Kim et al., 2018). 한편 Kim et al.(2018)은 이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선물 구매와도 그 과정을 비교하였는데, 모바일 선물하기와 마찬가지로 준비와 구매 과정에서 탐색비용을 줄이는 편의를 제공하지만 실물 제품의 선물 전달 단계에서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모바일 선물하기에서는 선물 제공자가 받는 이에게 선물하였음을 플랫폼을 통해 안내하면 수령자가 주소를 입력하는 개입이 이루어져 선물 제공자의 편의가 극대화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메신저 서비스를 기반으로 태동하였듯 모바일 선물하기는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SNS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김하연, 이상우, 2024; 전도현, 전현모, 2023; Hwang & Chu, 2019) 선물 제공자는 수령자와 플랫폼 내 연결되 어 소통과 선물 전달이 더욱 수월하다. 반면 이커머스를 통한 선물하기의 경우 Kim et al.(2018)은 실물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 선물 제공자가 받는 이의 배송지 정보를 알아내는 수고를 거쳐 직접 입력하는 차이가 있다고 논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당시의 Amazon을 상정하여 이커머스에서의 선물 구매 과정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현재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선물하기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국내 선물하기 서비스를 도입한 쿠팡, 네이버쇼핑, 컬리 등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은 모바일 기기의 보급에 따라 앱을 통한 모바일 커머스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선물 전달 단계에서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친구 목록,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또는 플랫폼 내 멤버 ID 정보를 활용하여 선물 사실을 전하고 선물 수령자가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을 구현한다. 따라서 선물 제공자가 경험하는 선물의 준비, 구매, 전달의 전 과정은 모바일 선물하기와 동일하며, 커머스 플랫폼마다 주력하는 제품 구색, 제품 정보 제시 방법, 배송 서비스 등의 차이만 존재한다(권혜정, 이남경, 2024; 김새롬, 이동일, 20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선물하기와 달리 선물의 준비, 구매, 전달이라는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선물 제공자의 편의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이커머스와 모바일 커머스를 통한 선물하기를 동일한 현대의 선물 행동으로 규정한다1).
더불어 모바일 선물하기가 갖는 고유의 특징에 주목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는데, Kwon et al.(2017)은 무형적인 디지털 선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선물 교환 과정의 특징을 규명하였다. 또한 비대면으로 전하는 선물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지 밝히기 위해 모바일 선물 행동이 개인의 사회자본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모바일 선물 행동이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양상으로 확산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김하연, 이상우, 2024; Kizilcec et al., 2018).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모바일 선물 행동을 이끌어내는 선행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실증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전통적인 선물 행동에 새로운 유통 기술이 접목된 것에 착안하여 혁신과 기술수용특성을 고려하거나(여현진 외, 2014; 이한석, 2013; 호엽, 최지호, 2014; Mamonov & Benbunan-Fich, 2017), 새로운 서비스로서 모바일 선물 플랫폼을 규정하고 e-서비스품질 차원에서의 인식이 선물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혔다(윤형선, 전현모, 2022; 전도현, 전현모, 2023). 그리고 모바일 선물 행동을 이끄는 다양한 선행요인을 규명했는데, 자발적 동기, 의무적 동기, 과거 경험 등 선물을 하는 행위 자체의 동인과(권혜정, 이남경, 2024; 여현진 외, 2014), 편의, 즐거움, 상징성, 경제성, 즉흥성 등 모바일 선물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기능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Sweeney & Soutar, 2001)에 기인한 동인의 영향을 검토하였다(여현진 외, 2014; 조승호, 조상훈, 2015; Hao & Hai-tao, 2020; Kim et al., 2018; Lee et al., 2020).
한편 선물 행동은 선물을 주고받는 양자 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Sherry, 1983) 사람들은 다양한 대상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물을 한다(Mauss, 2024). 나아가 선물은 제공자와 수령자 간 관계를 상징하고 선물을 주는 것은 이를 표현하는 사회적 행위로 기능한다(Belk, 1979). 선물 당사자 간 관계는 선물 행동을 일반 구매 행동과 구분하는 중요한 맥락적 요인이기 때문에(Givi et al., 2023), 선물 행동의 많은 연구들은 선물 당사자 간 사회적 거리, 사회적 지위, 권력 등 관계적 특성을 고려하였다(e.g., Chan & Mogilner, 2017; Choi et al., 2018; Goodman & Lim, 2018; Lee et al., 2024; Shi et al., 2024; Ward & Broniarczyk, 2011). 특히 선물 제공자와 수령자 간 관계는 거리가 가까운 사이에서 먼 사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거리(social closeness)의 연속성 상에서 존재하기에(Aron et al., 1992) 받는 사람을 연인,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가깝거나 먼 관계 유형으로 상정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e.g., Givi et al., 2021; Huang & Yu, 2000; Kupor et al., 2017; Liu et al., 2024; Parsons, 2002; Teigen et al., 2005).
그러나 모바일 선물 행동을 이해하는 맥락에서 선물 제공자와 수령자 간 관계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시도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이은지(2017)는 기프티콘을 이용한 모바일 선물을 제공자-수령자 역할과 친밀도에 따라 선물 만족감이 달라짐을 밝혔는데, 선물을 주는 경우 친밀한 관계일 때 더 높은 선물 만족감을 느끼며 선물을 받은 경우는 친밀도와 무관하게 선물 만족감이 높았다. 권혜정과 여민영(2021)은 모바일로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 성격의 선물을 하는 경우를 검토하였는데, 선물 제공자는 친밀도가 높을수록 상대방으로부터 보답 선물에 대한 기대가 감소함을 규명하였다. 또한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의 특성상 네트워크 규모, 즉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고려하여 선물 당사자 외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연구도 보고되었다(김하연, 이상우, 2024; Kim et al., 2018). 이러한 연구 시도를 확장하여 본 연구는 구체적인 관계 유형에 따라 모바일 선물 행동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고찰한다.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는 그 상호작용적 특성에 기반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비대면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려는 친화 욕구를 높인다고 밝혀졌다(이주영 외, 2014). 그러나 세부 관계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바일 선물하기가 선물 대상에 따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는지는 불명확하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선물 행동과 달리 모바일 선물 행동은 개방적인 디지털 네트워크를 토대로 약한 유대 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이한석, 2013). 최근 엠브레인(2023)의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도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선물하는 대상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고 인식한 응답자들이 71%로 나타난 대목은 모바일 선물 행동을 통해 선물을 주고받는 대상의 범위가 기존의 대면 선물에 비해 넓어졌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가 가깝거나 먼 관계 유형에 따라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지 검토하여 소비자들의 새로운 선물 행동에 대한 세분화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선물 당사자 간 관계는 사회적 거리의 연속선 상에 드러날 수 있는데(Aron et al., 1992), 이에 기초하여 Joy(2001)는 네 가지 관계 유형을 논한다. 즉 상대적으로 가까운 관계로 연인(“romantic other”)과 친한 친구(“close friend”), 적당한 거리에 놓인 보통 친구(“good friend”),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단순 지인(“just friend”/“hi-bye friend”)을 제시한다. 친한 친구는 서로의 안녕과 행복에 관심을 가지며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의존이 높아 상호작용이 빈번하거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높은 관계다(Dibble et al., 2011). 이러한 관계는 자신보다 상대방의 욕구 충족을 우선하며 상호 이익을 지향하는 공동체적 관계(communal relationship)로도 설명할 수 있다(Clark & Mills, 1979). 따라서 관계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깊은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된다. 또한 보통 친구는 친한 친구보다는 교류의 빈도가 낮고 상호작용의 깊이가 얕지만 단순 지인보다는 가까운 사이이다. 이에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 비해 기대치가 낮아 선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와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덜 수반된다(Joy, 2001). 한편 단순 지인은 대체로 피상적인 관계를 이루는 가볍게 아는 사이다. 교류가 제한적이고 관계 유지를 위한 투자도 가장 적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지식이 불명확하며 불완전하다(Goodman & Lim, 2018; Shi et al., 2024). 이들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제공할 때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교환적 관계로(exchange relationship), 호혜성이 중심이 되어 보상에 대한 의무감 또는 손익 계산이 작동한다(Clark & Mills, 1979; Lowrey et al., 2004). 아울러 연인은 친한 친구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거리가 가까우며, 서로가 감정적, 심리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친밀감(intimacy)이 높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면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다고 믿는 상호 간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Kim & Kim, 2019; Luo et al., 2019; McCarthy et al., 2017). 특히 연인과의 관계는 아가페적 지향(agapic orientation)에 기초하는데, 조건 없는 지지와 헌신을 중시하며 사랑의 표현이 선물 행동의 주요 목표가 된다(Belk & Coons, 1993).
선물 당사자 간 사회적 거리는 선물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관계가 가까울수록 선물을 전하는데 투입하는 자원이 더 커진다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 연인과 친한 친구를 위해 선물하는 경우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물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신중함을 기울이며 생일, 발렌타인 데이,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선물 등 다양한 계기로 선물을 주는 반면 단순 지인의 경우 그 정도의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Joy, 2001). 선물 지출의 차이도 보고되었는데, 연인, 가까운 가족, 친한 친구, 그리고 먼 가족을 비롯한 단순 지인의 순으로 드러났다(Saad & Gill, 2003). 또한 친한 친구에게 선물하는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선물을 작성한 ‘선물 리스트’가 제시되어도 소비자들은 해당 목록의 선물보다 자신이 고른 선물을 선택하여 상대방을 위한 노력을 표현하고자 한다(Ward & Broniarczyk, 2016).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도 가까운 대상으로부터는 사려 깊은 선물을 받기를 기대한다(Zhang & Epley, 2012). 더불어 연인에게 선물하는 경우 상대방의 취향이나 특성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그저 선물을 찾는데 그치지 않고 완벽한 선물을 찾는데 깊이 몰입하는데, 이는 아가페적 지향을 가진 소비자들이 선물을 구매하는데 시간, 금전, 노력의 자원을 더 크게 할애하며 선물 과정을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종의 과제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 깊다(Babin et al., 2007). 반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단순 지인을 위한 선물인 경우, 선물을 전하는데 투입되는 자원이 더 감소할 뿐 아니라 선물의 탐색 및 선택 과정에 감정적 개입을 줄이고 기능적인 접근을 한다(Lowrey et al., 2004; Fu et al., 2024). 또한 취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선물에 의한 당혹감을 피하고자 범용적인 범주의 전형적인 선물(conventional gift)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Camerer, 1988).
이러한 선행연구의 발견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관계 유형에 따라 선물 전달 방식이 선물 행동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다. 기본적으로 모바일 선물하기는 선물 구매의 편리함과 전달의 즉시성 차원에서 뚜렷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직접 만나 전달하는 전통적인 선물 방식에 비해 비인격성의 위험이 수반된다는 점에 주목한다(Kim et al., 2018). 즉 선물의 전달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배송이나 받는 사람의 수령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면 접촉에 비해 선물에 담기는 따뜻함과 정서적 교감이 제한적이다. 이에 Kim et al.(2018)은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의 비인격성에 대한 인식이 서비스 가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면 접촉을 배제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표정, 몸짓, 시선 등 비언어적 단서가 부족하여 메시지의 해석을 저해하고, 사회적 존재감이 낮아 상호작용의 가치를 낮추거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것과 관련 깊다(Balters et al., 2023; Brown et al., 2004; Walther, 1996). 또한 상대방이 선물을 사용하는 것이 수월하게 관찰될수록 선물 제공자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이유재, 차문경, 2013), 선물 수령에 대한 관찰 용이성이 떨어지는 모바일 선물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가까운 대상에게 선물할 때 증폭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가까운 사람과 교류할 때 그 관계가 위협받는 것에 대해 방어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e.g., Dubois et al., 2016).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다는 불안과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높으며,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소속 욕구를 갖는다(Baumeister & Leary, 1995; Downey & Feldman, 1996; Mishra & Allen, 2023). 무엇보다 가까운 대상에게 선물이 전달되는 순간 드러나는 상대방의 정서적 반응에 관심이 높으며(Yang & Urminsky, 2018), 가까운 관계일수록 선물에 노력, 시간, 금전을 더 많이 투입하여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남기는데 주력한다(Fu et al., 2024; Joy, 2001; Saad & Gill, 2003; Ward & Broniarczyk, 2016; Wooten, 2000). 따라서 모바일 선물하기를 통해 가까운 이에게 선물하는 것은 모바일 선물하기의 비인격성에 의한 사회적 위험을 크게 인식하고 심리적 비용이 높을 수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먼 대상에게 선물하는 경우, 관계의 깊이를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접근 하에 선물을 고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Fu et al., 2024),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관계 유형에 따라 선물 전달 방식이 선물 행동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소비자가 느끼는 심리적 비용에 기인한다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선물하기라는 비대면 전달 방식이 정성의 크기와 사회규범 준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선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한다. 선물 행동에 관한 방대한 선행연구는 어떤 선물이 가치 있는 선물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선물에 내재된 상징적 가치와 사회규범적 가치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해 왔다. 이는 선물이 기능적․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공자와 수령자 간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구성되는 상징적 소비 행위이기 때문이다(Givi et al., 2023). 선물 행동은 관계에 대한 상징적인 의례로 간주되기 때문에 선물 제공자는 선물을 전하는 행위를 통하여 선물을 받는 상대방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관계 유지 및 발전에 대한 관심과 헌신을 표현하고자 한다(Camerer, 1988; Mauss, 2024). 이에 선물은 관계 자체를 나타내며, 선물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상대방이 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전념하는지에 대한 정성의 크기로 선물의 가치를 판단한다(e.g., Givi et al., 2023; Zhang & Epley, 2009).
또한 선물은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며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행위로서 다양한 사회규범이 적용된다. 사회규범은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규칙”으로(Kupor et al., 2017, p. 2) 개인의 행동을 안내한다(Cialdini & Trost, 1998). 따라서 선물 행동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규칙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Caplow, 1984), 선물이 사회규범에 부합하느냐는 선물 행동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이고(Givi et al., 2023) 선물이 사회규범을 준수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선물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e.g., Kupor et al., 2017; Reshadi et al., 2023). 선물행동에 어떤 사회규범이 적용되는가는 시대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내용이 보고되었는데,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 선물에 의한 놀라움, 받는 이와의 적합성, 가격 등을 고려한 일련의 선택 규칙을 따르며(Caplow, 1984), 사회 내 통용되는 의례, 예상되는 호혜성, 선물의 상징성에 기반한 소비자 선물 시스템(consumer gift system)이 사회 내 존재하여 진화한다(Giesler, 2006). 또한 현금 선물의 적절성, 불확실한 선물의 회피, 의무적 선물에서의 순응 압력 등 다양한 규범적 반응이 보고되었다(Hudik & Fang, 2000; Kim & Kim, 2019; Mortelmans & Sinardet, 2005; Peng & Zeng, 2024; Shi et al., 2024).
이러한 선물의 규범적 판단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규범적 행위 초점 이론(focus theory of normative conduct) (Cialdini et al., 1990)에 주목한다. 이 이론은 어떤 규범이 사회 내 존재하는가보다 특정 상황에서 어떤 규범이 인지적으로 활성화되는가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Cialdini et al., 1990; Reno et al., 1993). 인류의 오랜 선물 문화에 비추어 소비자들은 선물은 대면하여 전달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익숙한 반면, 모바일 선물하기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전달 방식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모바일 선물하기가 사회규범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더 높은 인지적 초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모바일 선물하기는 상대방에게 선물을 직접 전하지 않는 비인격성을 지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전달된 선물이 관계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정성이 충분히 담겼는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선물이 사회규범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좋은 선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일상적 신념(lay belief)은 상대방을 위한 정성스러운 마음과 노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선물에 담긴 정성을 고찰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무엇을 줄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더 많은 금전적․비금전적 노력을 투입한 선물이 자신의 정성을 잘 나타낼 수 있다고 믿으며, 상대방이 크게 감사해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해당 선물의 가치를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고가의 선물을 저가의 선물보다, 지불이 완전히 완료된 선물을 금액이 더 크더라도 부분적으로 지불된 선물보다 더 사려 깊다고 여겨 선호한다(Flynn & Adams, 2009; Kupor et al., 2017). 반대로 할인된 제품이나 받는 사람이 요구한 제품을 선물하는 것은 정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다(Gino & Flynn, 2011; Park & Yi, 2022). 이처럼 상대방을 위한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은 좋은 선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됨에 따라 정성 어린 선물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Galak et al.(2016)은 선물 제공자들은 관대해야(generous) 한다는 일종의 선물 행동 원칙을 갖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나아가 최근 연구들은 ‘무엇을 주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 선물의 상징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한다(Givi & Das, 2021; Reshadi et al., 2023). 같은 선물이라도 포장, 증정 시점, AI 추천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소비자 반응이 달라지는데, 선물 제공자는 선물의 과대포장을 더 정성스럽다고 여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제때 전하지 못한 늦은 선물은 배려가 덜하다고 인식하여 부정적으로 여긴다(Haltman et al., 2024; Shi et al., 2024). 또한 AI 추천 도구를 활용하여 선택한 선물은 관계를 충분히 상징하지 못한다고 여긴다(Fu et al., 2024).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여, 본 연구는 모바일 선물하기라는 전달 방식이 정성과 사회규범 준수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물 행동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토한다. 특히 이 효과는 관계 유형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가까운 대상에게 비대면으로 선물하는 경우, 정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가까운 사람을 위한 돌봄 행동(caregiving)에서 자신의 수고를 줄여주는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그 기술로 인하여 상대방을 위한 돌봄의 질이 더 상승하더라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관련 깊다(Garcia-Rada et al., 2022). 직접 수행하지 않고 돌봄을 도와주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는데 제한적이라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물 제공자도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더욱 간편하고 쉽게 선물을 준비하는 혜택을 누린 사실로 인하여 가까운 사람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노력이 낮게 수반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 더불어 단순 지인보다 친한 친구에게 선물하는 경우 AI 선물 추천 도구의 사용 의도가 더 낮았는데, 이는 기술을 활용하여 가까운 대상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더 낮기 때문이다(Fu et al., 2024). 또한 상대방을 위한 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때 정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Shi et al., 2024) 모바일 선물하기로 선물을 간접 전달하는 것은 직접 선물할 때 보다 충분한 표현이 되지 못한다고 우려할 수 있다. 이에 연인이나 친한 친구와 같이 가까운 관계에 대한 모바일 선물하기는 선물에 담긴 정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고, 사회규범에 부합하다는 인식을 낮추어 선물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 선물 제공자는 모바일 선물하기를 통해 선물의 탐색에서 전달에 이르는 전체 구매 여정이 더욱 간편하고 쉬운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선물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정성이 낮아 그 사회규범적 가치도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가까운 관계에서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를 다음의 가설로 제시한다.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도식화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Ⅲ. 실증 연구
선물 전달 방식이 선물 행동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선물을 전하는 대상과의 관계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두 개의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연구 모형에서 상정한 가설 1과 2를 입증하기에 앞서 예비 조사 목적의 연구 1을 실시하였다. 즉 관계 유형에 따라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달 방식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는지 규명하기 위해, 직접 전하거나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두 대안이 주어졌을 때의 선택 양상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모형에 입각하여 관계 유형과 선물 전달 방식의 상호작용이 선물 행동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가설 1), 선물 전달 방식에 따라 얼마나 정성스럽다고 느끼는지와 사회규범을 준수한다고 느끼는지를 측정하여 이 효과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가설 2).
연구 1은 가설 검증에 앞서 관계 유형에 따라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는지를 규명한 예비 조사로 국내 리서치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의 패널을 대상으로 실험 참여자를 모집하여 수행하였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0~6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총 150명의 참가자들을 모집 및 분석하였다. 응답자는 남성 66명, 여성 84명, 평균 나이는 41.413세(SD=11.311)로 21세에서 68세까지 분포되었다. 세대별 분포는 20대 18%, 30대 26.667%, 40대 29.333%, 50대 20.667%, 60대 5.333%이다. 실험은 각각 연인, 친한 친구, 동료에게 선물하는 경우로 조작한 집단을 대조하는 일변량 피험자 간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관계 유형에 따라 연인, 친한 친구, 또는 동료 집단으로 무작위 할당하여, 상대방에게 생일 선물을 전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한 글을 읽도록 하였다. 즉 연인/친구/동료의 생일 선물을 고민하다 향수를 선물하기로 마음먹었고, 이 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자 한다고 제시하였다. 즉 향수를 구매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모바일 쇼핑 플랫폼에서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식 중 선택하고자 한다고 안내하였으며, 이어 참가자들은 선호하는 선물 전달 방식을 한가지 선택하였다. 더불어 평소 선물 행동에 대한 질문으로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변인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받은 경험의 유무를 질문하였다(“귀하는 주변인에게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물을 보낸/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별, 나이, 거주 지역, 교육 수준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문항에 응답하도록 한 후 실험은 종료되었다.
평소의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84.667%가 이를 이용하여 선물을 준 경험이 있고 90.667%가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비대면으로 선물을 전하는 모바일 선물 행동은 보편적인 선물 전달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음을 확인하였다. 과거 연구에서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비율이 불과 36.2%로 집계되었던 것과 비교하면(이주영 외, 2014) 괄목할 만한 선물 행동의 변화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모바일 선물하기는 비교적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점차 중장년층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박주연, 2022) 연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 경험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연령이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선물을 준 경험(1=네, 0=아니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항 로직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모바일 선물하기로 선물을 준 경험의 오즈비(odds)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β=–.049, Wald χ2(1)= 5.480, p=.019, Exp(B)=.952).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로 선물을 받은 경험도 마찬가지의 결과로 나타나(β=–.053, Wald χ2(1)=4.256, p=.039, Exp(B)=.948) 연령이 높은 층의 모바일 선물하기 경험이 젊은 층보다 더 낮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젊은 층의 소비자들이 모바일 선물하기 경험이 많은 것은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더 친숙하게 여김을 의미하며 선물하기 서비스 내 다양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엠브레인, 2023) 사용에 대한 효능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유형에 따라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한 선택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에 연령을 통제변수로 포함하고자 한다.
관계 유형에 따라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는지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관계 유형을 범주형 독립변수로, 선물 전달 방식의 선택을 이항 종속변수로(1=모바일 선물하기, 0=직접 전달), 연령을 통제변수로 하는 이항 로직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관계 유형은 선물 전달 방식의 선택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Wald χ2(2)=17.768, p<.001). 세부적으로 연인에게 선물하는 경우 동료와 비교했을 때 모바일 선물하기를 선택할 오즈비가 유의하게 더 낮아 가까운 관계에서 모바일 선물하기를 이용한 전달 방식이 덜 선호됨을 알 수 있다(β=–1.803, Wald χ2(1)=14.351, p<.001, Exp(B)=.165). 이는 사회적 거리가 가까워 그 관계가 위협되는 것에 민감한 경우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선물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가 부정적으로 여길 수 있다는 예상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실험에서 또 다른 가까운 관계로 상정한 친구에게 선물하는 경우, 동료에 비해 모바일 선물하기를 선택할 오즈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β=.010, Wald χ2(1)=.001, p=.981, Exp(B)=1.010). 더불어 연인과 비교했을 때는 모바일 선물하기를 선택할 오즈비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1.813, Wald χ2(1)=14.433, p<.001, Exp(B)=6.126). 친구에게 선물한 집단의 경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과 논의는 다음 절에서 제시한다.
연구 1은 연인, 친구, 동료와 같이 사회적 거리가 상이한 관계 유형에 따라 선물 전달 방식에 대한 선택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예상한 바와 같이 가까운 대상인 연인에게 선물하는 경우 모바일 선물하기를 선택할 오즈비가 동료와 친구와 비교하였을 때 모두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 새로운 선물 전달 방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회의 또는 우려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연인은 사랑의 표현이 행동의 주요 목표가 되는 아가페적 지향을 갖기 때문에(Belk & Coons, 1993) 직접 대면하여 접촉함으로써 선물과 더불어 따뜻함과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따라서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직접 전하는 것을 대체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동료는 연인에 비해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오즈비가 더 높아 새로운 선물 전달 방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실증적 증거를 확보하였다. 종합하면 관계 유형에 따라 선물 전달 방식의 선택이 달라지며, 모바일 선물하기의 활용이 보편화 되었지만 연인과 같이 친밀도가 높은 관계에서는 직접 전달에 비해 비선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이은지(2017)의 연구 결과에서 선물 제공자가 친밀도가 높을수록 비대면으로 전하는 선물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고 밝혀진 것과 상반되는데, 본 연구는 직접 선물 또는 모바일 선물하기 중 선물 전달 방식에 대한 선택으로 측정하였기에 가까운 관계에서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한 우려를 더욱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소비자들은 선물을 어떤 방식으로 전할지에 대한 선택에 실제 직면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현실 상황을 반영한 본 실험의 설계는 선물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전달 방식에 대한 선호가 다를 수 있음을 타당하게 검토하였다.
한편 친구에게 선물하는 경우, 비교적 거리가 먼 동료와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오즈비가 유사하게 나타나 예상과 다르게 가까운 관계임에도 선물하기 서비스를 선호하는 양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친구에 대한 정보가 다소 부족하여 오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극물에서 연인의 경우 ‘남자친구/여자친구 또는 남편/아내’에 해당하고 동료의 경우 ‘학교 동기 또는 직장 동료’라고 예시를 들어 누구를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한 반면, 친구는 그저 ‘가까운 친구’라고 표현하여 참여자들이 다소 모호하게 인식하였을 수 있다. 게다가 친구는 적당히 가까운 친구에서 절친한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참여자들이 시나리오를 보고 떠올린 대상이 일관적이지 않았을 수 있다. 즉 Joy(2001)의 관계 유형 분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친한 친구(close friend)가 아닌 보통 친구(good friend)로 인식되었다면, 연구에서 친구 집단을 가까운 관계에서의 선물 상황으로 조작하고자 한 의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연구 2에서 관계 유형을 엄밀히 조작하여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관계 유형과 선물 전달 방식에 따라 선물 행동 평가가 달라지는지(가설 1), 그리고 이 상호작용이 선물을 통해 인식한 정성의 크기와 사회규범의 준수 정도에 의해 차례로 매개되는지(가설 2)를 규명하기 위해 관계 유형과 선물 전달 방식을 조작하고, 선물 행동에 대한 평가와 정성, 사회규범 준수를 측정하는 시나리오 기반 실험을 수행하였다. 특히 관계 유형의 조작을 위해 더 정교하고 자세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연인, 친한 친구, 그리고 단순 지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실험 참가자들에게 의도한 수준으로 인식되도록 하여 연구 1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연령을 통제하는 것과 더불어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선물 제품의 매력도가 연구 모델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측정하여 통제하고자 하였다. 선물 제품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는 선물 행동 문헌에서 빈번하게 연구되었으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에(e.g., Baskin et al., 2014; Shi et al., 2024)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선물 제품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가 인식한 정성이나 사회규범 준수, 나아가 선물 행동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국내 리서치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의 패널을 실험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대한민국 거주자 만 20~6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총 480명의 참가자를 모집 및 분석하였다. 응답자는 남성 183명, 여성 297명의 구성과 평균 나이 43.273세(SD=10.943)로 22세에서 69세까지 분포되었다. 세대별 분포는 20대 10.208%, 30대 28.750%, 40대 30.625%, 50대 22.083%, 60대 8.333%이다. 선물을 직접 전하거나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두 전달 방식에 따른 선물 평가가 관계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2(선물 전달 방식: 모바일 선물하기 vs. 직접 전달) x 3(관계 유형: 연인 vs. 친한 친구 vs. 단순 지인)의 2요인 피험자 간 설계를 사용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관계 유형에 따라 연인, 친한 친구, 또는 단순 지인 집단으로 무작위 할당되었고, 해당 대상의 생일 선물을 전하는 시나리오를 읽도록 하였다. 우선 사회적 거리의 수준에 따라 상이한 관계 유형을 조작하기 위해 평소 만남의 빈도나 깊이, 친밀도 수준 등 관계의 주요 특성 중심으로 각 대상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였다(<부록 표 1>). 이어 해당 인물의 생일이 도래하여 바디워시를 선물로 전하였다고 언급하며 어떻게 전달하였는지에 대한 전달 방식의 조작을 하였다. 즉, 모바일 쇼핑 플랫폼의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거나 상대방을 만나 직접 전달하였다고 무작위로 할당하여 안내하였다. 시나리오를 읽은 후 참가자들은 선물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2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i.e., “선물을 전하는 것에 대해 나는”, 1=매우 부정적이다, 7=매우 긍정적이다; α=.929). 다음으로 선물 전달 방식에 담긴 정성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Flynn and Adams (2009)의 측정 항목을 맥락에 맞게 변형한 3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i.e., “선물하기 서비스로/직접 선물을 전하는 것은 사려 깊다”,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α=.902), 선물 방식이 사회규범에 얼마나 부합한지 측정하기 위해 Reshadi et al.(2023)의 측정 항목을 맥락에 맞게 변형한 2개 문항을 활용하였다(i.e., “선물하기 서비스로/직접 선물을 전하는 것은 사회규범적으로 적절하다.”, 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α=.864). 또한,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선물 제품이 얼마나 선물로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이를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i.e., “선물하기 전한 바디워시는”, 1=나쁜 선물이다, 7=좋은 선물이다; α= .729), 관계 유형에 따른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Ward and Broniaczyk(2016)의 측정 항목을 맥락에 맞게 변형한 3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i.e., “연인/친구/지인은 나와”, 1=매우 먼 사이이다, 7=매우 가까운 사이이다; α=.960). 마지막으로 연구 1과 동일한 인구통계학적 문항에 응답한 후 종료되었다. 실험에서 사용된 측정 항목들은 모두 <표 2>에 제시하였다.
| 변수명 | 측정 항목 | 출처 |
|---|---|---|
| 선물 행동 평가 |
선물을 전하는 것에 나는 (1) 매우 부정적이다 - (7) 매우 긍정적이다. 선물을 전하는 것은 (1) 매우 부적절하다 - (7) 매우 적절하다. |
Wu and Lee(2006) |
| 정성 |
선물하기 서비스로/직접 선물을 전하는 것은 사려 깊다. 선물하기 서비스로/직접 선물을 전하는 것은 정성스럽다. 선물하기 서비스로/직접 선물을 전하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데 충분하다. |
Flynn and Adams (2009) |
| 사회규범 준수 |
선물하기 서비스로/직접 선물을 전하는 것은 사회규범적으로 적절하다. 선물하기 서비스로/직접 선물을 전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준칙이다. |
Reshadi et al.(2023) |
| 선물 매력도 |
선물로 전한 바디워시는 (1) 나쁜 선물이다 – (7) 좋은 선물이다. 선물로 전한 바디워시는 (1) 모자란 선물이다. – (7) 충분한 선물이다. 선물로 전한 바디워시는 (1) 작은 선물이다. – (7) 큰 선물이다. 선물로 전한 바디워시는 (1) 별로인 선물이다. – (7) 매력적인 선물이다. |
본 연구 |
| 사회적 거리 |
연인/친구/지인은 나와 (1) 매우 먼 사이이다 – (7) 매우 가까운 사이이다. 연인/친구/지인은 나와 (1) 매우 어색한 사이이다 – (7) 매우 친한 사이이다. 연인/친구/지인은 나와 (1)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 (7) 매우 잘 아는 사이이다. |
Ward and Broniarczyk (2016) |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관계 유형에 따라 사회적 거리가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일변량 분산분석 결과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로 드러났다(F(2, 477)=34.814, p<.001). 연인에게 선물한 집단은 단순 지인에게 선물한 집단보다 선물 대상을 더욱 가깝게 느끼며(M연인=5.898, M단순 지인=5.077, F(1, 477)=54.206, p<.001), 친한 친구에게 선물한 집단도 단순 지인에 비해 더 가깝게 인식하였다(M친한 친구=5.867, M단순 지인=5.077, F(1, 477)=50.158, p< .001). 연인과 친구는 사회적 거리 인식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M연인=5.898, M친한 치구=5.867, F(1, 477)=.079, p=.779). 이로써 연인과 친한 친구는 자신과 가까운 친밀한 관계로, 단순 지인은 상대적으로 먼 관계로 인식되는 것을 확인하여 관계 유형에 따라 본 연구가 상정한 사회적 거리의 차이가 성공적으로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연구 2의 주요 변수인 정성과 사회규범 준수, 선물 행동 평가의 기초통계와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세 변수는 모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표 3>).
| 평균 | 표준편차 | 2 | 3 | |
|---|---|---|---|---|
| 1. 정성 | 5.690 | 1.187 | .638** | .475** |
| 2. 사회규범 준수 | 5.200 | 1.098 | .533** | |
| 3. 선물 행동 평가 | 5.097 | 1.090 |
다음으로 관계 유형과 선물 전달 방식에 따라 선물 행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선물 매력도와 연령을 공변량으로 포함하여 이를 통제한 이원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관계 유형과 선물 전달 방식에 따라 선물 행동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데, 시나리오에서 선물 제품으로 제시한 바디워시 자극물에 대한 태도가 달라 교란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연령 또한 관계 유형과 선물 전달 방식에 대한 인식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오로지 어떤 방식으로 선물을 전하는가에 따른 선물 행동 평가에의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누구를 위한 선물인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선물 전달 방식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며(F(1, 472)=21.798, p< .001) 관계 유형에 대한 주효과도 유의하였다(F(2, 472)=4.428, p=.012). 무엇보다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여 가설 1은 지지되었다(F(2, 472)=21.504, p<.001; <그림 2>). 공변량의 영향을 통제한 후 계산된 보정 평균에 근거하여 평균 차이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면, 연인의 경우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전하는 것을 직접 전달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가설 1a는 지지되었다(M모바일 선물하기=4.975, M직접 전달=6.263, F(1, 472)=57.969, p<.001). 친한 친구의 경우에도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전하는 것을 직접 전달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여기며(M모바일 선물하기= 5.718, M직접 전달=6.065, F(1, 472)=4.220, p=.040; 가설 1b 지지), 단순 지인의 경우에는 두 방식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M모바일 선물하기=5.692, M직접 전달=5.426, F(1, 472)=2.494, p=.115; 가설 1c 지지). 선물 매력도가 선물 행동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고(F(1, 472)=36.542, p< .001), 연령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F(1, 472)=1.288, p=.257).
관계 유형과 선물 전달 방식에 따라 자신의 정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마찬가지로 선물 매력도와 연령을 공변량을 통제한 이원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선물 전달 방식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며(F(1, 472)= 80.757, p<.001) 관계 유형에 대한 주효과도 유의하였다(F(2, 472)=4.994, p=.007). 무엇보다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드러났다(F(2, 472)=12.522, p<.001).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 대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인의 경우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전하는 것을 직접 전달하는 것보다 정성이 더 낮다고 평가하였으며(M모바일 선물하기=4.356, M직접 전달=5.657, F(1, 472)=75.822, p<.001), 친한 친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전하는 것의 상징적 효과를 더 낮게 인식하였다(M모바일 선물하기=4.920, M직접 전달=5.700, F(1, 472) =27.311, p<.001). 한편 단순 지인의 경우에는 두 방식에 의한 정성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M모바일 선물하기=5.160, M직접 전달=5.406, F(1, 472)= 2.733, p=.099). 선물 매력도가 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고(F(1, 472)=45.344, p<.001), 연령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F(1, 472) =.069, p =.793).
관계 유형과 선물 전달 방식에 의하여 선물 행동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를 선물의 정성과 사회규범 준수에 대한 인식에 의한 것이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누구에게 어떤 전달 방식으로 선물을 하느냐에 따라 선물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에 대한 상징적 가치가 달라지고 선물이 얼마나 사회규범을 따르는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조절된 직렬 매개효과(moderated serial mediation)를 검증하기 위한 PROCESS Macro (Model 83, 부트스트랩 5,000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Hayes, 2022). 분석에서는 선물 전달 방식을 독립변수(1=직접 선물, 2=모바일 선물하기), 선물 행동 평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조절변수인 관계 유형은 다항범주형 변수이기에 지표코딩을 통해 분석에 포함한 가운데 비교를 위해 지인 집단을 기준범주로 지정하였다: W1(지인 vs. 연인), W2(지인 vs. 친한 친구). 또한 정성과 사회규범 준수를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매개변수로, 선물 매력도와 연령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지인 집단과 연인 집단 간 선물 전달 방식에 따른 정성의 인식 차이가 유의하고(b= .534, boot SE=.211, 95% CI=[.120, .948]), 지인 집단과 친한 친구 집단 간 선물 전달 방식에 따른 정성의 인식 차이가 유의하여(b=1.055, boot SE= .210, 95% CI=[.641, 1.469]) 정성에 대한 조절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회규범 준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정성(b=.547, boot SE=.043, 95% CI=[.464, .630])과 선물 전달 방식(b=–.341, boot SE=.089, 95% CI=[–.515, –.166])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선물 행동 평가에서는 사회규범 준수에 대한 인식과(b=.196, boot SE=.046, 95% CI=[.106, .285])과 정성이(b=.561, boot SE=.049, 95% CI=[.465, .658]) 유의한 영향을 미친 가운데, 선물 전달 방식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 =.005, boot SE=.090, 95% CI=[–.171, .181]). 무엇보다 조절된 직렬 매개효과 지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Index W1=.057, boot SE=.028, 95% CI=[.013, .121]; Index W2=.113, boot SE= .042, 95% CI=[.045, .209] <그림 3>). 이는 관계 유형과 선물 전달 방식이 선물 행동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정성과 사회규범 준수의 직렬 매개효과를 통해 발생함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가설 2가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성과 사회규범 준수를 통한 간접효과는 연인 집단과(b=.084, boot SE=.029, 95% CI=[.036, .146]) 친한 친구 집단에서(b=.139, boot SE=.046, 95% CI=[.063, .239])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단순 지인 집단에서는 이러한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b=.026, boot SE=.017, 95% CI=[–.003, .065]).
연구 2는 선물 전달 방식에 따라 선물 행동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 누구에게 선물하는 상황인가에 대한 관계 유형이 조절하는지 확인하여 가설 1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연인이나 친한 친구와 같이 선물 제공자와 깊이 교류하며 정서적 유대감이 강한 경우 모바일 선물하기를 통해 전달한 선물 행동을 직접 전하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평가였으며(가설 1a, 1b), 약한 유대감으로 표면적인 관계을 갖는 단순 지인은 모바일 선물하기와 직접 선물하는 것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가설 1c).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소비자들에게 수반되는 심리적 비용에서 확인하고자 하여 얼마나 선물에 정성이 담겼다고 느끼는지와 사회규범을 부합한다고 느끼는지에 의한 메커니즘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관계 유형과 선물 전달 방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정성과 사회규범 준수에 의해 매개되는지에 대한 조절된 직렬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가설 2를 입증하였다. 연인이나 친한 친구와 같이 가까운 관계에서는 모바일 선물하기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직접 전달할 때 보다 선물에 담긴 정성의 크기가 더 작고 이는 좋은 선물에 대한 사회규범에 부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하기 때문에 선물 행동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관계가 먼 단순 지인은 모바일 선물하기를 통해 보내는 것과 직접 선물을 전하였을 때 정성과 사회규범 준수를 유사한 수준으로 여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선물하기 서비스의 활용 범위가 약한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는 대상들에게 확대된 현상(엠브레인, 2023; 이한석, 2013)이라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선물 전달 방식에 따른 선물 행동에 대한 평가가 관계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규명하고, 달라지는 이유를 소비자들이 느끼는 선물 전달 방식에 대해 갖는 심리적 비용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 1은 누구에게 선물하는가에 따라 직접 전하거나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간 선택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여 가설을 예비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연인에게 선물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가 먼 동료에 비해 선물하기 서비스의 선호가 낮은 것으로 드러나 관계 유형에 따라 선물 전달 방식에 의한 선물 행동 평가가 상이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근거를 얻었다. 연구 2는 관계 유형과 선물 전달 방식에 따라 선물 행동이 달라지며(가설 1), 이 상호작용이 선물에 담긴 정성과 사회규범 준수에 대한 인식에 의해 차례로 매개됨을 확인하여(가설 2) 연구에서 수립한 가설을 입증하였다.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관계 유형인 연인과 친한 친구의 경우, 직접 선물하는 것에 비해 모바일 선물하기를 통한 선물 행동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선물에 담긴 정성의 크기가 더 작고 사회규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기인하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거리가 비교적 먼 관계 유형인 단순 지인은 선물 전달 방식에 따라 선물의 정성과 사회규범 준수 정도에 대한 차이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선물 행동의 평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까운 대상에게 선물하는 경우 모바일 선물하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선물의 상징적 가치와 규범적 가치가 절하될 것이라는 심리적 비용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반면 상대적으로 덜 친밀한 단순 지인의 경우 새로운 선물 방식이 정성이나 사회규범 준수 차원에서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덜하여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한 심리적 비용이 크게 수반되지 않고 직접 선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물 행동을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들이 선물하기 기능을 갖추고 서비스를 강화함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대면하여 선물을 직접 전하는 전통적 방식과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전달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주변인에게 선물할 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어떤 방식으로 선물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도 함께 이루어지는 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에 관계 유형에 따라 선물 전달 방식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고, 구체적으로 선물 전달 방식이 상이한 소비자 심리를 야기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로써 선물 연구에서 “어떻게 선물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아직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다는 지적에(Reshadi et al., 2023) 호응하고, 다양한 대상과 전달 방식을 아우르는 선물 행동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더불어 선물 연구에서 기술 혁신과 접목한 실증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Givi et al., 2023) 선물 구매와 관련하여 부상한 모바일 커머스의 맥락에서 선물 행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특히 모바일 선물하기가 갖는 비대면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Kim et al., 2018)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규명한 첫 시도라는 의의를 갖는다. 즉, 모바일 선물하기를 통해 선물을 전하는 것은 선물의 정성과 사회규범 준수에 대한 우려, 즉 선물이 가져야 하는 상징적 가치와 규범적 가치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동반할 수 있음을 밝혀 소비자들의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는 모바일 선물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혜택(i.e., 편리함)을 전제로 모바일 선물하기의 동기 또는 소비자 특성을 규명하는데 주력한 것과 대비되는 발견이다(권혜정, 이남경, 2024; 여현진 외, 2014; 이한석, 2013; Kim et al., 2018; Lee et al., 2020).
특히 본 연구는 인류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선물을 전하는 과정을 진일보시킨 새로운 유통 형태와 서비스의 현재 양상에 기초하여 모바일 커머스 기반 선물하기에 대한 최신의 지식을 제공한다. 선행연구는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들이 제공하던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의 초기 형태에 입각하였다. 이에 모바일 선물하기가 특별한 날이 아닌 일상의 비교적 저가 선물을 전하는 마이크로기프팅(microgifting)에 활용된다고 제시하고(Kim et al., 2018), 따라서 디지털 상품권 또는 교환권(e.g., 기프티콘)을 선물로 전하는 맥락에서 주로 연구되었다(이은지, 2017; Hwang & Chu, 2018). 그러나 현재 모바일 또는 이커머스 기업이 제공하는 선물하기 서비스는 저가의 가벼운 선물뿐 아니라 고가의 명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하여 실물 제품을 받는 이와 직접 만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달하는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일상적인 소통 외 생일, 기념일을 포함한 특별한 날을 위한 선물을 전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선물하기가 소비자들에게 활용되는 실정이다(엠브레인, 2023).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의 비대면 선물 유통 양상에 기초하여 실물 제품을 모바일 선물하기로 전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선물 행동이 선물을 주고받는 양자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누구에게 전하는 것인가에 대한 관계적 맥락을 고려하여 모바일 선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한 문헌에서 관계 특성은 친밀도와 네트워크 규모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권혜정, 여민영, 2021; 김하연, 이상우, 2024; 이은지, 2017) 이를 확장하여 본 연구는 구체적인 관계 유형에 따라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본 의의가 있다. 더불어 선물 연구는 대부분 친구와의 선물 상황을 상정하여 이루어지며 동료 또는 연인을 위한 선물 연구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Freling et al., 2024), 본 연구는 세 가지 관계 유형 모두를 주목하고 각 유형에 따라 어떤 선물 전달 방식이 선호되는지 규명하였다. 가까운 관계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에(Cavanaugh, 2016) 연인과 친한 친구의 경우를 구분했고, 친한 친구와 단순 지인은 개인의 삶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상이하며 관계의 특성 차이가 명확하기에(Fu et al., 2024) 구분을 지었다. 무엇보다, 모바일 선물하기를 통해 기존에 주로 선물을 주고받던 가까운 관계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먼 단순 지인에게 선물하는 행위가 증대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세 유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관계 유형에 따라 모바일 선물하기로 주고받는 선물에 담긴 정성의 크기를 다르게 인식하고 이것이 선물을 둘러싼 사회규범에 부합한가에 대한 상이한 판단을 가져옴을 밝혀, 새롭게 등장한 선물 전달 방식이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여겨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 유형에 따른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는 새로운 선물 방식의 규범적 가치를 미국 사회 맥락에서 검토한 Reshadi et al.(2023)의 발견을 한국 사회의 맥락에 적용하는 것뿐 아니라 관계 유형별로 발견을 심화한 것이다. 특히 단순 지인의 경우 선물 전달 방식에 상징적, 규범적 가치의 인식과 선물 행동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 모바일 선물하기의 개방성과 편의를 토대로 선물 대상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약한 유대 관계의 대상에게도 선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공한다.
나아가 선물이 사회규범를 준수하는가의 규범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 선물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정성이라는 상징적 가치에 기초한다는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정성이 담긴 선물이 ‘좋은 선물’로 여겨진다는 생각이 일상적 신념에 그치지 않고 선물에 대한 사회규범으로 존재함을 규명하였다. 선물에 담긴 정성의 크기와 사회규범 준수/위배 정도는 선물 행동에 대한 문헌에서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연구되어 왔으나 두 변수는 주로 개별적으로 검토되었다(e.g., Gino & Flynn, 2011; Givi, 2020; Haltman et al., 2024; Reshadi et al., 2023). 본 연구는 규범적 행위 초점 이론을 토대로 두 변수가 직렬적인 구조에 놓일 수 있음을 규명하여 기존 논의와 다른 접근을 제시하였다. 즉 선물에 담긴 정성이 선물의 사회규범적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입증하였다.
선물은 사회문화적인 함의를 가질 뿐 아니라 주변인과의 관계를 위한 일상적인 소비 의례로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구매의사결정의 한 형태이다(Saad & Gill, 2003). 이러한 맥락에서 선물 행동은 기업에 있어 새로운 수익 창출과 시장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선물 전달 방식으로 부상한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전통적인 직접 전달 방식과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의 확산 이면에 존재하는 심리적 비용의 가능성을 규명함으로써 유통 기업과 유통 플랫폼에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관계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들이 선물 대상별로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의 세분시장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각 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 기반 세분화 전략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특히 연인이나 친한 친구와 같이 가까운 관계에서 선물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지 않고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선물 제품의 매력도와 상관없이 전달 방식에 담긴 정성과 사회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연인이나 친한 친구에게 선물하는 경우 정성이나 사회규범 준수에 대한 심리적 비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UX/UI를 세심하게 설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령 선물과 함께 전하는 메시지의 템플릿을 손편지 형태로 제공하거나 영상 메시지 첨부 기능을 활용하여 따뜻한 접촉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대면 선물 전달의 비인격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물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Haltman et al., 2024) 생일 또는 기념일의 예약 발송 기능으로 적시의 선물 전달을 보장할 수도 있다.
나아가 모바일 선물 행동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물 제공자가 선물에 기울인 정성과 노력을 인정해주는 다양한 장치를 활용함으로써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한 심리적 비용을 완화할 수 있다. 가령 모바일 선물하기 활용 빈도, 대상 범위, 금액, 제품 종류, 브랜드 등 선물 구매 내역의 분석을 바탕으로 선물 제공자가 주변인들을 돌보기 위해 모바일 선물하기를 통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알리고, 선물 제공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는지 정량적, 정성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선물의 상징적, 규범적 가치를 준수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선물 제공자의 “정성 지수”, “선물역량 지수”로 표현하거나 어떤 선물을 주로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e.g., “원하는 선물을 주는 산타”, “실용적인 선물을 하는 솔루션 제공자”, “소소한 기쁨을 전하는 메신저”)를 내려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해 소비자들이 갖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기효능감과 행복감까지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규명한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커머스 플랫폼의 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고안해볼 수 있다. 즉, 선물 제공자가 선물을 전하는데 얼마나 편리하고 수고를 덜어주는지에 대한 실용적 혜택을 중심으로 핵심 가치를 논하기보다, 간편하지만 정성과 사회적 적합성은 그대로인 감성적인 혜택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선물과 선물로 인한 행복한 관계라는 주제에 얼마나 진심인지 그 진정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도적인 수준의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모바일 선물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국내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들의 선물하기 서비스는 다양한 제품군과 용도, 대상을 아우르며 여타 국가의 선물하기 서비스보다 발전된 양상이다. 미국 Facebook은 선물 서비스를 한때 운영했으나 2014년 부로 중단하였으며(Rey, 2014) Amazon은 기프트 카드 선물이 지배적인 가운데, 실물 제품 선물하기는 2021년 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실정이다(Schlosser, 2021). 일본 LINE은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메신저에 기반한 선물하기 서비스가 있지만 편의점, 카페 쿠폰 등 젊은 층의 소액 선물에 국한되어 있으며, 중국 WeChat은 디지털 돈봉투(红包, hongbao) 기능 위주의 운영으로 모바일 송금이 보편적인 가운데 2024년 말에 들어서야 실물 선물 기능을 본격화하고 있다(Leo, 2024; LINE Gift). 이에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모바일 선물하기가 더욱 발전되는데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한 사실을 적용하여 성공적인 운영 전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학문적, 실무적 의의를 갖지만 한계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필요가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관계 유형에 따라 선물 전달 방식에 의한 선물 행동 평가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그 현상을 밝히고 이를 설명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제품 특성과 선물 상황을 추가로 고려하여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한 더욱 폭넓고 섬세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직접 전달하거나 모바일 선물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두 방식을 비교하는 가운데 실물 제품을 선물하는 경우를 연구하였는데 제품의 유형 또는 속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본 연구의 두 실험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향수와 바디워시는 국내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의 선도주자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다양한 대상에게 선물 제품으로 널리 활용되기에 실제 모바일 선물 상황과 부합할 수 있는 실험 자극물로 선택되었다. 그러나 화장품이 갖는 쾌락적 혜택과 대비되는 실용적 혜택의 제품(예: 가전, 건강식품)을 선물하는 경우 선물 전달 방식과 관계유형에 따른 선물 행동 평가 양상이 어떤지 비교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선물 상황에서 관계에 대한 표현적 동기가 높을수록 쾌락적 속성이 두드러지는 선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실용적인 선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Kim & Kim, 2017) 선물 대상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쾌락재를 실용재보다 선물로 더 선호한다는(Gong et al., 2025) 연구 결과들과 결합하여, 선물 전달 방식에 대한 평가가 누구에게 어떤 제품을 선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지 밝힌다면 더욱 완전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실물 제품 외에도 모바일 선물하기에서 흔히 사용되는 디지털 기프트 카드, 디지털 교환권, e-티켓과 같은 디지털 제품(Atasoy & Morewedge, 2018; Kwon et al., 2017)의 속성에 주목하여 이것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이로써 가까운 연인이나 친한 친구에게 선물할 때 직접 선물하는 것보다 모바일 선물하기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특정한 제품 유형 또는 속성에 국한되거나 강화되는지, 혹은 차이 없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지 규명할 수 있다.
나아가 선물을 주는 상황 또는 목적에 따라 선물 전달 방식과 관계 유형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검토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 주제이다. 본 연구는 생일 선물 상황을 상정하고 실험하였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대개 특별한 날에 선물을 더 빈번히 주고받으며(Givi & Galak, 2021)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 또한 플랫폼 내 교류하는 주변인의 생일을 알려주는 기능으로 생일 선물을 독려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확산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김정훈, 2025). 그러나 선물은 주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적과 맥락을 갖는다. 매년 반복되는 생일이나 기념일 외에도 입학, 졸업, 출산, 집들이 등 선물을 주고 싶은 그러나 반복적 성격이 약한 선물 상황이 존재하며(Freling et al., 2024) 이러한 특별한 이유마저 없는(“just because”) 선물 상황도 있다(Givi & Galak, 2021). 특히 모바일 선물하기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소식을(e.g., 졸업 후 취직/미취직) 접한 것에 대해 즉흥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데 활용되며(Hwang & Chu, 2019), 대화 중 느끼는 감정을 실시간으로 표현하기 위해 소소한 선물을 전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카카오는 대화 중 ‘축하’, ‘감사’ 등 감정 표현을 자동 인식하여 적절한 선물을 추천하는 기능을 카카오톡 대화방 내 도입 중으로(신동현, 2025) 일상 소통과 공감의 도구로 선물을 정립한다. 따라서 생일 외 다른 선물 상황에 따라 본 연구에서 규명한 현상이 더 강화되거나 완화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 수준에 따른 관계 유형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연인과 친한 친구, 단순 지인과의 선물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친구의 경우 Joy(2001)가 친한 친구와 보통 친구로 구분하였듯 사회적 거리의 스펙트럼이 넓고 각각의 관계 특성도 상이하여 선물의 대상으로 여겼을 때 소비자들의 주된 동기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친구의 유형에 따라 혹은, 친구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사회적 거리에 따라 선물 전달 방식에 의한 선물 행동 평가가 달라지는지를 검토한다면 더욱 정교한 연구 모델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한 심리적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단순 지인의 경우도 세분화하여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여 더욱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단순 지인은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와 같이 자신과 동일한 집단에 속하여 일상의 접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단지 상호작용 빈도와 친밀감이 낮은 경우로 전제하였으나, 이 외에도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상호작용으로 관계 강도가 약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행 중 만난 동행자나 프로젝트성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교류한 동료 등 자신과 이질적인 집단에 속하며 상황적 맥락에서 제한적인 상호작용을 나눈다. 이러한 대상에게도 감정이나 마음을 표현하는 소통의 일환으로 선물이 활용되기 때문에 모바일 선물하기라는 새로운 전달 방식과 결부하여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계의 발전 가능성 또는 발전 의지 차원에서도 단순 지인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시점 가볍게 안면이 있는 사이더라도 향후 관계가 깊어지며 가까워질 여지가 있다면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한 심적 비용이 커질 개연성도 있다. 이러한 관계의 미묘한 측면까지 고려하여 복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약한 유대감을 기반으로 한 단순 지인 간 모바일 선물하기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선물 제공자의 입장에서 모바일 선물하기를 통한 선물 전달을 검토하였으나 선물의 효용은 선물을 주고받는 양측 모두에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령자 입장에서의 연구를 전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선물 행동 관련 문헌에서 선물 제공자와 수령자 간 불일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된 것을 고려하면(Freling et al., 2024) 모바일 선물하기에 대해서도 선물을 전하거나 받는 입장에 따라 혜택과 비용에 대한 인식이 상이한지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선물 제공자와 수령자 간 불일치는 선물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는데(Waldfogel, 1993), 디지털 기프트 카드는 수령자가 원하는 선물을 고를 수 있어 이러한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Doğan & Bourreau, 2018).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 또한 수령자가 원하는 옵션 선택이나 상품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물 전달 방식에 대한 평가에서 선물 제공자와 수령자 간 불일치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선물 수령자 입장에서 모바일 선물하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선물을 직접 전하거나 모바일 선물하기를 이용하는 것을 비교하는데 대면 또는 비대면이라는 상호작용의 특성에 주안점을 두고 그것이 선물 과정에서 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 비용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선물 전달 방식에 따라 상호작용 특성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의 활용 및 의존 여부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향후 고려한다면, 의미 있는 대안 가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스마트폰은 개인화되어 있고 사적이며 촉각적 만족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심리적 위안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Melumad & Pham, 2020), 이러한 정서적 혜택이 타인을 위한 선물을 하는 상황에서 선물 불안(Wooten, 2000)을 낮춘다면 모바일 선물 행동에 긍정적 평가를 야기할 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선물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는가의 전달 방식에 따라 소비자가 선물을 준 행동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얼마나 매력적인 제품을 선물로 주는지에 대한 제품의 평가를 연구 2에서 측정하여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 2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선물에 대한 평가의 측정항목에서 비롯하되(e.g., Baskin et al., 2014; Chan & Mogilner, 2017; Liu et al., 2022; Shi et al., 2024) 선물의 매력도에 대한 인식을 더욱 구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 새롭게 개발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내적 일관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지만(α=.729), 측정 항목의 신뢰도와 타당도 대한 정량적인 검증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통제된 시나리오 기반 실험을 통해 가설을 엄밀히 검증하였으나, 실제 모바일 선물 환경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적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실제로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여 실제 행동을 추적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거나, 플랫폼과 협업하여 실제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선물 제공자들의 소비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다룬 연령 외 성별, 소득 등 인구통계적 변수, 그리고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의 사용 경험을 드러내는 선물 빈도, 선물 금액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